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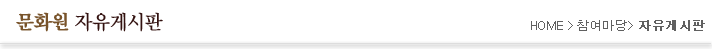 |
 작성일 : 19-07-01 08:33
작성일 : 19-07-01 08:33
|
상주시 은척면 나옹정(懶翁亭) - 김광희[문화관광해설사]
|
|
|
글쓴이 :
상주문화원
 조회 : 7,924
|
상주시 은척면 나옹정(懶翁亭)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82
백두대간 속리산 천왕봉(天王峰, 1058m)에서 남으로 형제봉에 이르러, 동으로 갈령에 내려앉아 다시 청계산을 이루고, 배너미 고개와 남산을 돌아 칠봉산을 빗고, 다시 작약산(芍藥山, 770m)을 크게 솟구치니 이를 「갈령 작약지맥」이라 이름한다. 작약산 줄기가 동남으로 뻗어내려 감싸 안은 곳에, 이곳 산천의 경관(景觀)이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방불케 한다는 뜻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세곡리(細谷里), 신당리(新堂里), 상리(上里), 하신리(下新里) 일부와 함창군 상서면의 신리(新里)와 아천리(雅川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무릉리(武陵里)라 하고, 작약산에서 시작하는 영곡천(靈谷川)이 흐른다.
무릉리와 이안면 구미리 경계 지역에 나옹정(懶翁亭)이 있는데, 이곳은 느티나무 3그루가 한곳에 모여 마을의 휴식공간으로 정자 구실을 한다. 이 나무는 고려 시대 나옹화상(1320~1376)이 심었다고 전하는데, 비(碑)에는 ‘구거수 기념비(舊巨樹記念碑)’라 새기고, 가정(稼亭) 이곡(李穀, 1298~1351)과 친밀하여 이곳을 왕래할 때 심은 것이라고 한다. 들판 이름도 나옹들이고, 구미리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나옹정(이안면 구미리 939-4, 제단)이 있으며, 마을 뒤 약수터 큰 바위(석연암) 옆 느티나무(구미리 산54-1)도 나옹화상의 얘기가 전한다. 이는 모두 간재(簡齋) 김택(金澤)의 사위였던 이곡과 함께 일대의 산수를 사랑해 자주 왕래할 때 심은 느티나무라는 것이다. 경상도 영해지방에 살던 사족(士族) 간재(簡齋)는 본관이 함녕 김씨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가정은 ‘급제하기 전에 유람(遊覽)으로 영해에 와서 김택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으며, 고녕 가야 왕족 후예의 장인 간재에 대한 특별한 애정 때문에 좋은 곳이 많았지만, 간재는 함창이 가까운 이곳(이안면 아천리)을 사랑했지 아니하였을까 미루어 짐작해본다.
함창현지에는「懶翁亭 在郡西二十里九尾洞 麗僧普濟與稼亭李穀徃來遊詠所植槐木尙在三株對立淸陰可愛傍近學子或講習其下若用腥膻之物則白日輒雷雨聲 亭有二上曰上懶翁下曰下懶翁 (군서 이십 리허의 구미 동구에 있었으며 고려의 승 보제가 가정 이곡과 함께 왕래하며 유영하던 곳이니 그때 손수 심은 괴목 세 그루가 아직 서 있어 청음이 두터우니 인근에 학자들이 혹 그 아래에서 강습을 하기도 하나 만약 비린 냄새가 나는 물건을 들여오면 백일에도 뇌우성이 일어나할 수 없게 하였다. 정이 둘인데 위에 것은 上 나옹정 아래 것은 下 나옹정이다.)」이라 적고 있으며,
이안면 구미 마을에서는 중간에 있는 느티나무를 당목(堂木)으로 삼고, 동제(洞祭)를 지내는데, 그 축문에는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幼學 000 敢昭告于 懶翁亭 守護神 尊灵監善降福 沐浴齋戒 三日致誠 洞民平安 尊卑日親 日新又新 日益繁盛 無災無害 百福攸臻 五穀且稔 六畜共繁 謹以酒果 脯肉祗薦 共伸奠獻 祰祀 尙 饗」이라 읽는다. 속전(俗傳)으로 나옹화상이 이 마을에 거주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이 느티나무 주변의 들 명 또한 나옹들이고, 나옹과 관련한 얘기가 많이 전한다.
나옹화상의 법명은 혜근(慧勤), 법호는 나옹(懶翁), 속성은 아(牙)씨, 당(堂)은 강월헌(江月軒)으로 영해(지금은 창수면)에서 아버지 아서구(牙瑞具)와 어머니 정씨(鄭氏) 사이에 태어났다. 같이 놀던 절친했던 친구가 죽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자 괴로워하며 공덕산(지금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 묘적암으로 요연(了然) 선사를 찾아 출가하였다. 이후 양주 회암사(檜岩寺), 원나라 연경(燕京) 법원사(法源寺), 해주 신광사(神光寺) 등에 머물며 공민왕의 배려로 불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1376년(우왕 2) 왕명으로 밀양 영원사로 가던 도중 여주 신륵사에서 열반하니, 세속 나이 57세, 법랍 37이었다. 저서로 나옹화상 어록(보물 제697호) 등이 있다.
한산군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임금의 명을 받아 비문을 짓고, 공신 권중화가 쓴 비(碑)가 여주 신륵사에 전해오고 있다. 비록 왕명이었지만 아버지의 벗이었던 나옹화상의 비문을 아들이 쓴 것만도 드문 일이며, 뿌리 깊은 인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목은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는 찬성사 가정(稼亭) 이곡(李穀)이며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영덕군 영해면 망월봉 아래 햇볕이 잘 드는 곳 괴시리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간재의 외손자이다. 이 마을의 이름은 처음에는 호지 촌이었는데, 목은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의 괴시와 비슷하다 하여 '괴시'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곳은 남씨 집성촌으로 영덕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청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숙제이고, 큰 화두(話頭)라 이때 읊조리는 제목도 모르는 친숙한 시(詩),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잡고 티 없이 살라 하네. (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聊無愛而無憎兮)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如水如風而終我)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蒼空兮要我以無垢)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 놓고, (聊無怒以無惜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如水如風而終我)」는 작품의 높은 명성에 비해 작자를 잘 모르는 이가 많으나, 이는 나옹화상(懶翁和尙,1320~1376) 작품이다. 그는 조선건국에 크게 영향을 끼친 무학 대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상주는 나옹정 외에도 갑장산 아래 갑장사(甲長寺) 개기(開基)는 1373년(공민왕 22년) 나옹화상이 열었다고 전하고, 용흥사 극락보전 역시 나옹화상이 창건하였다고 기문(記文)에 적고 있다. 지척에 도 지정 기념물 뽕나무와 은행나무, 죽림 서당, 작약산(宰岳山), 천감지지(天感之地)의 감암정(感巖亭), 동아제약 연수원 등 이처럼 문화유적과 스토리가 많은 이 지역에 나옹화상의 시(詩) 한 수와 가정, 목은 관계를 설명한 안내판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

